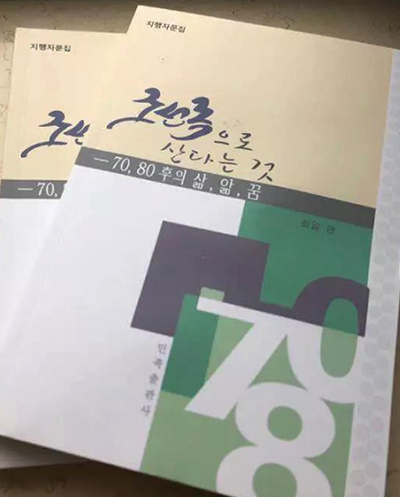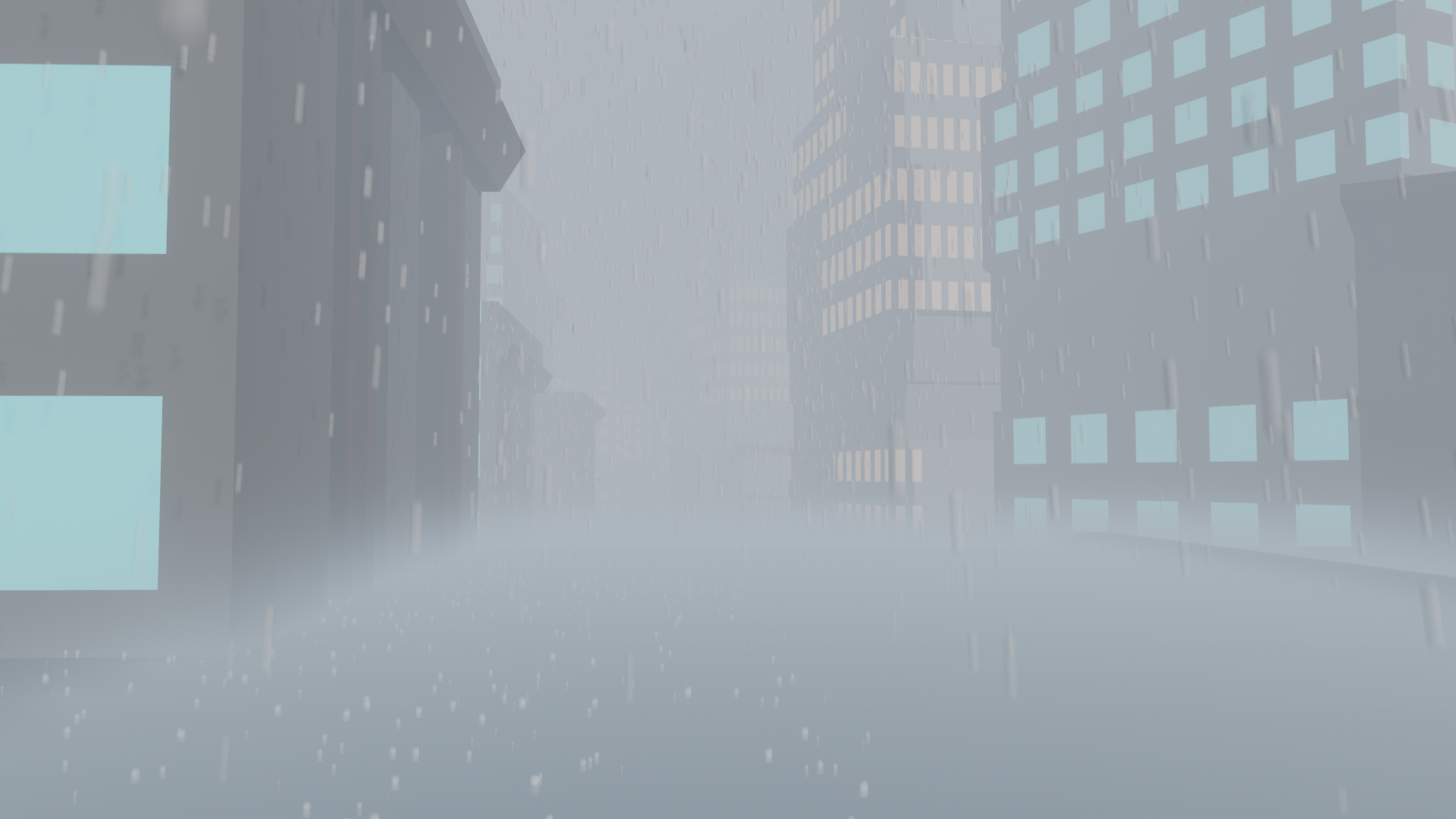Blog
-
가릉빈가문 (迦陵頻伽文):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다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를 소재로 한 문양.
이 새는 극락정토에 깃들이며 인두조신(人頭鳥身)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소리 또한 묘하여 묘음조(妙音鳥)·호음조(好音鳥)·미음조(美音鳥)라고도 하며, 극락에 깃들인다 하여 극락조라 부르기도 한다.
Written by
-
아이에게 행복의 코드를 쥐여주자
조선족문화를 지키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승함으로써 중국의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성스로운 시대적 사명이다.
Written by
-
조선족 민족 가무를 힘써 부축해야 할 데 관한 생각들
현재 조선족 민족 예술은 인식 부족, 인재 결핍, 낮은 대우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전문가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조선족 민족 가무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Written by

-
‘쓰러’지는 모교를 보면서
불편한 진실이라도 똑바로 정시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문자를 비롯한 문화적 ‘동일성’은 ‘하나’로 무어지는 근간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노력을 몰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족들은 점차 우리 언어문자나 문화생활과 멀어지고 있다.
Written by
-
기획: 흙으로 빚어내는 우리 삶의 이야기
조선족민속도예제작기예 주급무형문화유산 전승인 김영옥 지난 18일 기자는 조선족민속도예제작기예 주급무형문화유산 전승인 김영옥 장인을 만나 그의 손끝에서 탄생되는 도예 작품들의 뒤이야기, 그리고 그가 작품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흙을 찾아내고 반죽하고 조각하고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과정에서 마음과 열정을 담아 새로운‘생명’을 불어넣는다. 도예가는 손으로 한점한점의 흙을 빚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문외한이 보기에는 똑같은 흙 같지만 어떤…
Written by
-
연변대중음악의 재기를 꿈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변 대중음악은 어느 위치에 서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1세대의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2~3세대를 거쳐 그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Written by
-
조선족으로 산다는 것—70, 80 후의 삶, 앎, 꿈
“70, 80후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전 세대와 같은 곡조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많이 달라졌다. 우리에게는 거대담론이 없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만큼 했고 문명의 혜택도 많이 누린 70, 80후 세대는 외국으로, 대도시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세대이다. 후세들에게 우리 이 세대는 어떤 세대로 남을가?” — “후세들에게 우리 이 세대는 어떤 세대로…
Written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