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 비암산 지명을 두고 푸른 정기가 도는 바위가 많아 한자 푸른 벽(碧)자와 바위 암(岩)자를 붙이여 비암산(碧岩山)이라고 한다는 설, 산형태가 피파(琵琶)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암산(琵岩山)으로 불리여졌다는 설, 코등처럼 산세가 볼록 튀여나와 코(鼻)자를 넣어 비암산(鼻岩山) 이름이 유래되였다는 등 여러가지 지명설이 있다.
함경도 방언에는 험하고 가파른 언덕 벼랑을 뜻하여 비양이라는 말이 있다. 일제강점기 해란강에 다리를 놓고 해망동과 엄씨마을 (화룡 비암촌)을 거쳐 비암산 굽이를 휘돌아 소철이 부설되여있었다. 해망동과 엄씨네 동네는 비암산 벼랑 쪽에 바짝 붙어 형성된 취락구조를 가진 마을들로서 예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비암산을 비양데기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비양데기 지명은 오래동안 한자어 표기에 밀려서 세월의 비바람에 이끼가 끼고 마모되여 오늘날에 와서는 판독하기조차 어려워지게 되였다
룡정시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는 룡정과 연변의 문화를 보여주는 창구이다. 비암산 지명이 새겨져있는 커다란 바위돌들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유람구 곳곳에 세워져있다. 오늘도 이런 바위 앞에서 여러 지명풀이 버전이 란무하여 떠도는 것을 보면 우리 문화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여다보게 된다. 넓은 산판에 화려한 꽃밭이 펼쳐져있고 올려다보는 협곡과 유리다리의 풍경도 근사하다. 이런 물질적 풍요와 현대감각을 자랑하는 시설과 달리 우리가 차려올린 문화의 잔치상은 초라하다. 관광개발의 핵심가치는 경제와 문화가 나란히 부흥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유람구에서 아직까지도 단순한 경제적 리윤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면 조선족 민속문화를 발전시킨다고 내세운 슬로건이 무색해진다.
날이 갈수록 자의 반 타의 반 연변을 떠나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탈고향 과정은 삶의 공간으로서 고향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뉴대관계 공동체 의식, 자기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화려하든 초라하든 평강벌과 세전벌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양데기는 세속적으로 가난하지만 자연과 정서적으로는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곳이다.
비양데기 옛길은 우리의 력사와 문화가 흐르던 고개길이다. 높이 솟은 비암산으로 구불구불 뻗은 장대길, 산 중턱을 감도는 아침안개, 평강벌에 도란거리며 흐르는 논도랑 물, 소낙비 그친 뒤 저녁노울 붉게 타는 들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 그리고 감자밭 옆 아버지 곁에 묻힌 어머니 묘, 우리에게 비양데기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로 시작되는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비암산은 그 구석구석을 파헤쳐보면 함경도 사투리 비양데기라는 땅 이름이 스며들어 있고 선인들의 그 투박하고 웅글진 억양이 짙게 배여 메아리처럼 다시 귀전에 울려오는 곳이다.
비양데기에 가득 쌓아놓은 선인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후손들 기억 속엔 얼마나 저장되여있을가… 잘못된 지명풀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여 우리 문화는 영원히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을 두고 평강벌과 세전벌을 묵묵히 일궈왔던 선인들의 진실된 력사와 마주앉아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흩어진 이들 삶을 하나하나 반추하여 비암산 땅이름을 또박또박 적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명 하나를 옳바르게 쓴다는 의미를 넘어 영원히 마음속 깊이에 새겨 넣는 일이다.
혹독한 세상과 맞서 싸워온 선인들의 삶을 정직하게 담고 있을 때 비로소 비암산 지명은 전설이 될 수 있고 또 세월 강을 건너 오래오래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정신없이 변하는 통에 우리는 갑자기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비양데기라는 땅 이름은 연길시 해란강골프장 옛 계림촌 마을과 용신 대신촌에도 있었다. 이런 지명은 조선족 마을 취락이 자리하고 있었던 표징인데 이런 지명이 사라지면 문화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면 력사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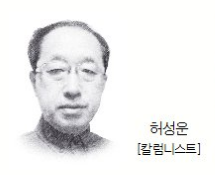


답글 남기기